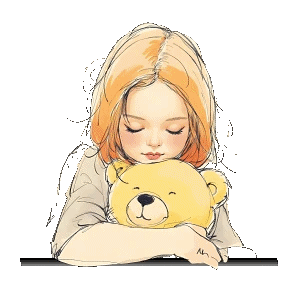어느 소녀에 관한 기억..
유년시절.. 80년대 신림동 가파른 고갯길 끝 작은집의 작은 셋방 유리창 밖으로 활짝 핀 노란색 개나리를 마음껏 볼 수 있던 시절…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조금씩 토사가 무너져 내린 지면을 경계로 그 위로는 허름한 판자집들이 있었고 달동네라고 불리던 곳 이었다. 달동네 아래 비록 판자집은 아니지만 단칸방 작은 공간에서 달동네를 보며 자랐다. 우리는 자주 달동네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구슬치기, 잣치기, 오징어 가위상 등을 하며 놀았고 그 높은 언덕까지 올라오는 자동차는 직업군인이셨던 주인집 아저씨의 짚차 말고는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짚차가 오면 짚차에서 내리는 많은 먹꺼리와 음료수를구경하는 재미로 놀기도 했었다.
지대가 높아 수도물이 나오는 날보다 안나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았었기에 하루에 두 번 찾아오던 커다란 물탱크 차가 짚차 말고 그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않던 유일한 차이기도 했었다.
양동이며 바께쓰.. 혹은 커다란 물통을 대문 앞에 내어 놓고 소방차처럼 물을 내뿜는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하루 하루를 살곤 했었다. 그 당시 너무 어려 세상을 몰랐던 나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쓰는게 당연한 것인줄 알았었다.
달동네에서 내려와 힘들게 물을 길어가는 어른들과 달동네 바로 아랫동네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음이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그 때 누군가 물통에 크게 휘갈겨 적어 놓았던.. 물없는 세상 못 사냐던 글귀가 오래도록 어린가슴에도 남았었고 세월이 흘러 수돗물 걱정 없는 집에서 살면서도 저 글이 의미하는 푸념과 한탄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이제와 생각나는 것도 당시의 풍경보다 물통에 적혀있던 넋두리가 더 진한 것을 보면.. 양 손에 물 양동이를 들고 물을 나르던 고생보다 그 때의 애잔함이 더 마음아팠던 듯 싶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동네인지라 달동네와 그 아랫동네의 완충지역 쯤 되는 비탈 중간에도 산비탈에 붙은 듯 지어진 집들이 여러채 있었다. 달동네 판자집과 아랫동네 양옥집의 중간 위치인 지라 그 집들은 저마다 긴 오르막 계단이 있었으며 그 가파른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야 대문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집의 대문 안에서 올려다보는 달동네는 목을 한껏 뒤로 젖혀도 보이지 않을 가파른 각도 안에 있었으며, 내려다 보는 아랫동네는 가물가물 먼 고개 아랫길 끝자락 집 마당 구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와이드한 뷰를 가지고 있었다. 흡사 남산타워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전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 골목길을 접하고 있는 집들의 아이들과 셋방살이 아이들이 모여 골목을 휘저으며 놀고 있으면 항상 그 가파른 계단 끝 대문 안 장독대에 올라 우리를 말없이 내려다 보곤 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하교하는 모습을 가끔 보았던 터라 같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 일 꺼라는 건 알았지만 몇 학년인지도 알지 못했다. 말 붙여본 아이도 없었고 또래에 비해 말이 없고 문 밖에 나와 노는 것도 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한참 동안을 내려다 보고만 있는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쓰는 아이는 없던 듯 했다. 어느 날 부터인가의 나만 빼고…
언제 부터인가… 우리가 시끄럽게 놀아도 나와보지 않을 때면 괜히 수시로 올려다 보며 그 아이를 찾게도 되었고.. 그러다 다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그 아이를 보게 될 때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더 신나게 놀게도 되었었다.
사실 어느 때고 말붙일 연습도 하고는 있었다. 내려와서 같이 놀자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 그게 어려워 차일 피일 미루며 그 소녀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만 늘려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사춘기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자주 눈길이 마주칠수록 발그레진 얼굴로 먼저 고개를 돌리던 것도 나였으며, ‘오늘은 꼭..’ 이라고 연습했던 말들도 하얗게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으니까…어느 날인가.. 항상 표정없이 우리를 지켜보던 소녀였는데… 어느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치는 그 때, 그 소녀의 얼굴에 스쳐가는 미소를 보았다. 뭔가 웃음꺼리가 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같고.. 기억은 안나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 아이의 미소다..
내려와서 같이 놀자는 말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기를 한참… 두근거림에 심호흡 크게 하고 용기를 내 보려던 순간.. 누가 부른듯 아이는 담장아래로 모습을 감췄다.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가라앉은 심장 박동에 정상호흡을 쉬면서 갑자기 세상 시간은 또 다시 늘어져 길게 흐르는 것만 같음을 느꼈었다. 몇 번째 인지 모를 ‘내일은 꼭..’ 이라는 다짐을 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가파른 계단 끝 그 아이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주변의 어른들과 아이들의 얘기로는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더란 것이었다.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싶던.. 그 많은 순간들을… 그 후로도 한참을 기억하며 무척 많이도 아쉬워 했었다. 언젠가 다시 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려와서 같이 놀자고 말붙여 볼 수 있기를.. 내 유년시절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은 어린 소녀에게.. 꼭 그 말을 전하고 싶다..
추억 속의 그 소녀를 만나게 되면… 그 때는 주저없이 말붙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이사는 왜 갔으며,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싶다. 우선은 “네 이름은 뭐니?” 라고 시작을 한 후에… 신림동 산비탈 골목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다 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고… 묻고 싶다.. 그리고 그 때의 미소도…